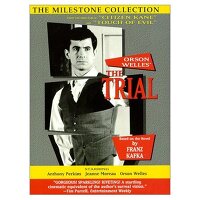국립현대미술관은 정말 좋은 곳이다.
대학생은 무료이기에 더더욱 좋은 곳이다.
게다가 '막간'이라는 프로그램은, 국내에서 개봉도 안 한 작품들까지도 큰 스크린으로 상영해주고 있기에 아주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다.
'언어와의 작별'은 국내에서 개봉도 안 했고. 촬영감독의 GV까지 있어서 찾아갔다.
이전에 봤던 영화들 모두 관객이 별로 없었는데, 이번에는 GV덕분인지 120석이 꽉 차서 사람들이 계단까지 꽉 찬 상태로 영화를 봤다.
영화가 시작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많은 관객들이 나갔다.
상영 도중 이렇게 많은 관객들이 나가는 영화도 처음 봤다.
3D영화이고 촬영감독이 상영 전에 이 영화를 이해하려고 하지 말라고 당부했는데, 당부한 이유가 있었다.
애초에 이해를 할 수가 없는 방식의 영화이다.
아니, 장뤽고다르는 관객들에게 영화를 이해시키는 것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
러닝타임이 70분인 것이 다행으로 느껴졌다.
서사가 아예 없고, 이미지가 서사가 되는 방식도 아니었고, 그냥 단편적인 이미지들의 반복이라서 영화보다는 미디어아트에 가까워보였다.
촬영감독이 연출한 단편도 상영해줬는데 장뤽고다르의 장편과 흡사했다.
어떤 관객이 물었다고 한다.
이 작품을 이해할 열쇠를 달라고.
그 질문에 대해 이 영화에는 문이 없다고 대답했다고 한다.
소리와 이미지보다 자신의 내면을 보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고 한다.
형식보다 느낌을 중요시하라고 하기에는, 이 영화의 형식이 관객이 느끼게 될 느낌에 대한 배려가 조금도 없다고 생각한다.
기존 3D영화와는 3D를 활용하는 방식 자체가 달랐다.
대부분의 관객은 이러한 방식이 신선하기보다 불편했을 것이다.
장뤽고다르 말고 어떤 감독이 과연 이런 방식으로 3D촬영을 할까.
나는 솔직히 이러한 말들이 가이드라인이라기보다 나태한 소리로 들렸다.
관객에게 모든 것을 떠넘긴 것 같아 불편했다.
장뤽고다르라는 거장의 명성을 뺴고나서, 이 영화를 어떤 무명 미술가의 비디오아트라고 하고 상영했다면 과연 이 영화가 칸영화제에서 수상을 할 수 있었을까.
이 영화를 보고 걸작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그렇다면 영화의 형식이 아니라 '느낌'으로 이 영화를 걸작이라고 하는 것일까.
그렇다면 영화비평이 이 영화를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일까.
데이빗 린치의 '인랜드 엠파이어'와 흡사한 느낌이 들었다.
물론 '인랜드 엠파이어'는 훨씬 긴 러닝타임을 가지고 있고, 그나마 서사가 있긴 하고, 3D 영화도 아니다.
두 영화 다 내겐 힘겨운 체험이었다.
견뎌내고 나면 단단해지는 종류의 영화가 있다.
그런데 이 영화는 견디고 싶다는 욕망조차 안 생기는 영화이다.
장뤽고다르가 영화사에서 가장 중요한 인물 중 한 명이라는 것에는 명확히 동의하지만, 그렇다고 그의 명성 때문에 그의 모든 작품에 동의한다고 고개를 끄덕이는 것은 우스운 짓이다.
장뤽고다르의 초기작들을 다시 한 번 봐야겠다.
'Movie'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테이크 쉘터 (Take Shelter, 2011) (0) | 2015.05.10 |
|---|---|
| 카프카의 심판 (Le Proces, The Trial, 1963) (0) | 2015.05.10 |
| 신의 소녀들 (Dupa dealuri, Beyond the Hills, 2012) (0) | 2015.05.03 |
| 영 앤 뷰티풀 (Jeune et jolie, Young & Beautiful, 2013) (0) | 2015.05.03 |
| 천주정 (天注定, A Touch of Sin, 2013) (0) | 2015.05.03 |